1. 어린 시절 및 교육
음와이 키바키는 1931년 11월 15일, 당시 케냐 니에리 구역의 오타야(Othaya) 지구에 위치한 가투야이니(Gatuyaini) 마을에서 농민인 키바키 기틴지(Kibaki Gĩthĩnji)와 테레시아 완지쿠(Teresia Wanjikũ)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 이탈리아 선교사들에 의해 세례명으로 '에밀리오 스탠리'를 받았지만, 공직 생활 내내 '음와이 키바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구전에 따르면, 어린 음와이는 아버지를 도와 양과 소를 방목하고 어린 조카들을 돌보며 성장했다. 그의 초기 교육은 누나에게 학교 대신 가족을 돌보라고 주장했던 매형 폴 무루티(Paul Muruthi)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키바키는 가투야이니 마을 학교에서 2년간 초등 교육을 마쳤고, 이후 카리마 선교 학교에서 3학년 과정을 마쳤다. 1944년부터 1946년까지 마타리 학교(현재 니에리 고등학교)로 옮겨 학업과 더불어 목공과 석공 기술을 배웠는데, 이는 학생들이 가구를 수리하고 학교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직접 조달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는 학교 방학 동안 해체된 오타야 아프리카 버스 연합(Othaya African Bus Union)에서 차장으로 일하며 용돈을 벌었다. 카리마 초등학교와 니에리 기숙 초등학교를 거쳐 1947년부터 1950년까지 명문 망구 고등학교(Mang'u High School)에 진학했으며, 졸업 시험에서 6과목을 1등급으로 통과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망구 고등학교 재학 시절, 키바키는 고향에서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의 영향을 받아 군인이 되려는 포부를 가졌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 최고 장관이었던 월터 쿠츠(Walter Coutts)가 키쿠유족, 엠부족, 메루족 공동체 출신 인원의 군 입대를 금지하면서 그의 군사적 열망은 좌절되었다. 키바키는 대신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마케레레 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1955년 경제학 학사 학위를 최우수 성적으로 취득했다. 졸업 후 그는 동아프리카 셸(Shell Company of East Africa) 우간다 지부에서 영업 매니저 대리로 일했다. 같은 해, 그는 영국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고, 명문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등록하여 공공 재정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58년 마케레레 대학교로 돌아와 1961년까지 경제학과 조강사로 재직했다. 1961년에는 당시 중등학교 교장이었던 교회 목사의 딸 루시 무토니(Lucy Muthoni)와 결혼했다.
2. 정치 경력 (대통령 이전)
키바키는 1960년대 초 학계에서의 경력을 뒤로하고 케냐의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다양한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다.
2.1. 초기 정치 활동 및 KANU 참여
1960년 초, 음와이 키바키는 토마스 조셉 음보야(Thomas Joseph Mboya)의 요청으로 마케레레 대학교의 조강사직을 그만두고 케냐로 돌아와 KANU(Kenya African National Union)의 행정 책임자가 되면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또한 케냐의 독립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하며 독립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1963년, 키바키는 나이로비의 돈홈 선거구(Doonholm Constituency, 이후 바하티(Bahati), 현재는 마카다라(Makadara)로 알려짐)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그의 오랜 정치 경력의 시작이었다. 같은 해 그는 재무부 영구 차관으로 임명되었고, 1963년 재무부 차관 겸 경제 기획 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했다. 1966년에는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재무 및 경제 기획부 장관을 역임했다.
1974년, 키바키는 돈홈 선거구에서 경쟁자 재엘 음보고(Jael Mbogo)와의 치열하고 논란이 많았던 1969년 선거 승리에 이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나이로비에서 고향인 오타야로 옮겼다. 이후 그는 오타야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79년, 1983년, 1988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선거에서 연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같은 해, 타임지는 그를 미래를 이끌 잠재력을 가진 전 세계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2.2. 내각 각료 및 부통령
1978년 조모 케냐타의 뒤를 이어 다니엘 아랍 모이가 케냐 대통령이 되자, 키바키는 부통령으로 승진했으며, 재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았다. 그는 1978년 세계은행 아프리카 담당 부총재직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정치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는 오늘날까지 케냐 공화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중요한 재무부 장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대통령이 되어서도 재무부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유지하며 주요 경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1982년, 모이 대통령은 그의 장관직 포트폴리오를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변경했다. 1988년 3월, 키바키는 모이 대통령의 신임을 잃고 부통령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보건부 장관으로 이동했다.
이 시기 키바키의 정치적 스타일은 신사적이고 비대립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그에게 "강단 없는", 심지어 "비겁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가져왔는데, 그는 결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 농담에 따르면, "그는 결코 앉지 않은 울타리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비슷하게 케네스 마티바(Kenneth Matiba)도 1988년 부통령직에서 해임된 후 KANU 정부를 사임하고 야당에 합류하기를 거부하자 그를 "General Kiguoya키구오야 장군kik"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키쿠유어로 "두려워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는 또한 당시 정치적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집권 일당인 KANU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로 자신을 투영했다. 1992년 다당제가 도입되기 전 몇 달 동안, 그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KANU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면도날로 무화과나무를 자르려는 것과 같다"고 악명 높게 선언하기도 했다.
2.3. 야당 활동 및 대통령 선거 출마
따라서 1991년 12월 케냐 헌법의 섹션 2A 조항이 폐지되어 다당제 정부 시스템이 복원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키바키가 정부에서 사임하고 KANU를 떠났다는 소식은 전국에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사임 직후, 키바키는 민주당(Democratic Party, DP)을 창당하고 다가오는 1992년 다당제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키바키는 모이 대통령의 도전자들 중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으나, 선거가 부족주의적 노선에 따라 치러지면서 그의 지지 기반은 주로 키쿠유족 유권자들에게서 나왔다. 이는 다당제 초기에 모이와 정치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키바키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당시 분열된 야당은 전체 투표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 대통령과 KANU에게 패배했다. 이후 1997년 선거에서는 모이 대통령에게 2위를 차지했는데, 다시 한번 모이 대통령은 분열된 야당을 누르고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키바키는 3위를 차지한 라이라 오딩가와 함께 모이 대통령이 선거를 조작했다고 비난했으며, 두 야당 지도자 모두 모이의 다섯 번째 임기 취임식에 불참했다.
2.4. 2002년 대선 승리
2002년 선거를 앞두고 키바키의 민주당은 여러 다른 야당과 연합하여 국가동맹(National Alliance of Kenya, NAK)을 결성했다. 당시 퇴임하는 모이 대통령이 조모 케냐타 초대 대통령의 아들이자 키바키의 후임이 될 우후루 케냐타를 KANU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자 이에 반발한 KANU의 실망한 대통령 후보군들이 KANU를 탈당하고 서둘러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LDP)을 창당했다. NAK는 나중에 LDP와 합쳐져 국민무지개연합(National Rainbow Coalition, NARC)을 형성했다. 2002년 10월 14일, 나이로비의 우후루 공원에서 열린 대규모 야당 집회에서, 라이라 오딩가가 유명한 선언인 "Kibaki Tosha!스와힐리어" (스와힐리어로 "키바키 [면] 충분하다!")를 외치며 키바키는 NARC 야당 연합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2002년 12월 3일, 키바키는 마차코스 분기점(나이로비에서 40 km 떨어진)에서 선거 운동 회의를 마치고 나이로비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사고로 골절 부상을 입은 그는 나이로비에서 입원한 후 런던으로 이송되었다. 사고 이후 그는 대통령 재임 수개월 후까지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는 이 부상으로 인해 다소 어색하게 걸었다.
그의 대통령 선거 운동은 그가 부재한 상태에서 라이라 오딩가와 키자나 와말와(Kijana Wamalwa, 이후 부통령이 됨)가 이끄는 NARC 동료들이 "주장이 경기장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팀의 나머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지칠 줄 모르고 키바키를 위해 선거 운동을 펼쳤다.
2002년 12월 27일, 키바키와 NARC는 KANU에 압승을 거두었으며, 키바키는 대통령 선거에서 62%의 득표율을 얻어 KANU 후보 우후루 케냐타의 31%를 크게 앞섰다.
3. 대통령 재임 기간 (2002-2013)
음와이 키바키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케냐에 상당한 변화와 도전을 가져온 시기였다.
3.1. 취임 및 리더십 스타일

2002년 12월 30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던 키바키는 수많은 환호하는 지지자들이 운집한 나이로비 시내의 역사적인 우후루 공원에서 케냐 공화국의 제3대 대통령 겸 군 통수권자로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식에서 그는 정부 부패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정부는 더 이상 개인의 변덕에 따라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키바키의 취임은 독립 이후 40년간 케냐를 통치해 온 KANU 정권의 종식을 의미했으며, 24년간 집권했던 다니엘 아랍 모이는 퇴임했다.

키바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대중의 주목을 꺼리는 조용하면서도 매우 지적이고 유능한 기술관료의 그것이었다. 그는 전임자들과 달리 개인 숭배를 조장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초상화가 케냐 통화의 모든 단위에 실리거나, 모든 종류의 거리, 장소, 기관이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거나, 국가가 승인한 찬양가가 그를 위해 작곡되는 일은 없었다. 또한 그의 대통령 활동에 대한 뉴스가 일상적이거나 평범하더라도 뉴스 속보를 장악하는 일도 없었고, 전임자들의 대중영합적 선전 문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그에게 겉보기에는 무관심하고 고립된 기술관료 또는 지식인의 이미지를 부여했으며, 대중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한 그의 위임 위주의 리더십 스타일은 그의 정부, 특히 내각 차원에서 기능 장애를 겪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3.2. 첫 임기 건강 문제
키바키가 나이와 2002년 교통사고로 인해 이전의 재치 있고 활동적이며 유창했던 모습을 잃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다. 한때 메모 없이도 의회에서 길고 화려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그는 모든 포럼에서 연설문을 읽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2003년 1월 말, 키바키 대통령이 교통사고 후유증인 다리의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나이로비 병원에 입원했다고 발표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TV를 통해 대중에게 연설했지만, 눈에 띄게 비일관적인 모습이었고, 이후 그가 1970년대에 한 차례 겪었던 뇌졸중을 두 번째로 겪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그의 이후의 건강 악화는 첫 임기 동안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을 크게 저하시켰고, 당시 정부 업무는 정부 내외의 충성스러운 측근 집단에 의해 대부분 운영되었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25일 마이클 와말와 키자나(Michael Wamalwa Kijana) 부통령의 사망 후 무디 아워리(Moody Awori)를 부통령으로 임명하기 위해 TV 생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키바키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
3.3. 주요 정책 및 이니셔티브
키바키 행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케냐의 발전에 기여했다.
2003년 1월, 키바키는 무상 초등 교육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여, 학비 부담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05년 7월 키바키를 만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3년에는 지역구 개발 기금(Constituency Development Fund, CDF)이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지역구 수준의 풀뿌리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지역 간 발전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고, 당파적 정치로 인한 지역 발전 불균형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풀뿌리 수준에서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는 모든 지역구 개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췄다. CDF 프로그램은 국가 예산 할당에서 일반적으로 간과되었던 외딴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 새로운 수자원, 보건, 교육 시설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CDF는 2010년 헌법에 의해 도입된 분권형 정부 시스템을 향한 첫 단계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 정부 구조가 헌법적으로 재설계, 강화 및 확대되었다.
키바키 대통령은 또한 2030년까지 GDP 성장을 연간 10%로 끌어올리고 케냐를 중산층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개발 계획인 케냐 비전 2030(Kenya Vision 2030)의 수립을 감독했으며, 2006년 10월 30일에 이를 발표했다.

키바키 재임 기간 동안 케냐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GDP 성장률은 2002년 최저 0.6%에서 2003년 3%, 2004년 4.9%, 2005년 5.8%, 2006년 6%, 2007년 7%로 상승했으며, 2007년~2008년의 선거 후 혼란과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2008년 1.7%, 2009년 2.6%를 기록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5%로 회복되었다.

과거 소외되고 largely 미개발 상태였던 반건조 또는 건조한 북부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개발이 재개되었다. 2003년 이전 완전히 붕괴되었던 많은 경제 부문이 회복되었다. 모이 재임 기간 동안 붕괴되었던 수많은 국영 기업들이 부활하여 수익성을 내기 시작했다. 통신 부문은 호황을 누렸다. 티카 고속도로와 같은 여러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등 인프라 재건, 현대화 및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모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졌다. 케냐의 도시들도 긍정적으로 재정비되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키바키 정권은 또한 서구 원조에 대한 케냐의 의존도를 줄였으며, 세수 증가와 같은 내부적으로 생성된 자원을 통해 국가 재정이 점점 더 충당되었다. 키바키 재임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그리고 다른 비서구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현저히 개선되고 확장되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의 호랑이들, 브라질, 중동,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심지어 이란도 점점 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
3.4. 2005년 헌법 국민투표 및 내각 개편
2005년 11월 21일 2005년 케냐 헌법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헌법 개정 과정의 주요 쟁점은 케냐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였다. 이전 초안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여, 보편적 참정권으로 선출되는 의례적인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행정 총리 간의 유럽식 권력 분배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케냐 법무장관 아모스 와코(Amos Wako)가 국민투표를 위해 제출한 초안은 대통령에게 여전히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키바키는 이 제안을 지지했지만, 라이라 오딩가가 이끄는 자유민주당(LDP) 소속 내각 일부 인사들은 주요 야당인 KANU와 연합하여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유권자의 58%가 초안을 거부했다.
국민투표 패배의 결과로, 그리고 그 직후인 2005년 11월 23일, 키바키는 행정부 임기 중간에 전체 내각을 해산하며 라이라 오딩가와 연대한 모든 장관들을 숙청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키바키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재편하여 더욱 결속력 있고 케냐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중도 해임에서 제외된 내각 구성원은 부통령 겸 내무부 장관 무디 아워리와 헌법적으로 지위가 보호되는 법무장관뿐이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을 포함한 키바키 충성파로 구성된 새로운 내각이 '국민 통합 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 GNU)'로 명명되어 임명되었으나, 일부 장관직 제안을 받은 의원들은 취임을 거부했다.
케냐 조사 위원회인 와키 위원회(Waki Commission)의 보고서는 일부 쟁점을 맥락화했다. 이들은 키바키가 비공식 양해 각서(MoU)를 통해 총리직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선 후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키바키가 선거 전 합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대중이 이를 "키바키 정부가 권력을 나누기보다 독점하려는 시도"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3.5. 2007년 대선 및 선거 후 폭력 사태
2007년 1월 26일, 키바키 대통령은 2007년 케냐 대통령 선거에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07년 9월 16일, 키바키는 재선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을 아우르는 새로운 연합인 국민통합당(Party of National Unity, PNU)의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연합에 참여한 정당에는 크게 위축된 구 집권당 KANU, DP, 나르크-케냐(Narc-Kenya), 포드-케냐(Ford-Kenya), 포드 인민당(Ford People), 시리키쇼(Shirikisho) 등이 있었다。
키바키의 주요 경쟁자인 라이라 오딩가는 헌법 국민투표 승리를 발판 삼아 오렌지민주운동(Orange Democratic Movement, ODM)을 출범시켰고, 2007년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칼론조 무스요카(Kalonzo Musyoka)는 라이라의 ODM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고, 이로써 주요 후보인 현직 키바키와 오딩가 간의 경쟁이 더욱 좁혀졌다. 선거 당일까지의 여론조사는 키바키가 전국적으로는 라이라에게 뒤처졌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키바키가 중앙주, 엠부, 메루현에서 대부분의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칼론조 무스요카의 고향인 우캄바니에서는 칼론조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 결과 분쟁 및 선거 후 폭력 사태**
사흘 뒤, 키바키의 고향인 중앙 케냐 지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마지막으로 발표되었는데, 의혹 속에서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라이라의 ODM이 맹렬히 항의하는 가운데, 밤샘 재집계와 나이로비의 케냐타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TV로 생중계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시위 진압 경찰이 개표소를 봉쇄하고 당 대표자, 참관인, 언론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엘 키비투(Samuel Kivuitu)를 다른 방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키비투는 키바키가 4,584,721표를 얻어 오딩가의 4,352,993표를 누르고 당선되었다고 발표했으며, 키바키는 오딩가에 약 23만 2천 표 앞서 치열한 경쟁 선거에서 승리했고 칼론조 무스요카는 훨씬 뒤처진 3위를 기록했다.
한 시간 뒤, 급하게 소집된 저녁 취임식에서 키바키는 나이로비 대통령궁에서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취임 선서를 했고, "국민의 심판"이 존중되어야 하며 "치유와 화합"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키바키가 국민의 심판을 존중하지 않고 강제로 집권하려 한다고 느낀 수많은 케냐인들의 항의로 긴장이 고조되고 시위가 발생했다.
결과 발표 직후, 오딩가는 키바키가 선거 사기를 저질렀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오딩가의 주장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으며, 선거 전 여론조사와 예상, 그리고 선거 당일의 출구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득력 있어 보였다. 더욱이 정치적 권력이 키쿠유족 정치인들의 손에 집중되는 것에 반대하며 선거 운동을 펼쳤던 오딩가는 다른 대부분의 케냐 부족과 지역의 표를 얻었으나, 키바키의 승리는 인구가 많은 키쿠유족, 메루족, 엠부족 공동체의 거의 전적인 지지로 달성되었다. 이들 공동체는 오딩가의 선거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리고 키바키 캠페인의 은밀한 장려로 인해, 오딩가 지지 부족들의 위협에 포위된 느낌을 받아 대거 키바키에게 투표했다. 더욱이 ODM은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 의석에서 큰 차이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다. 영국 외무부와 국제 개발부의 공동 성명은 불규칙성에 대한 "진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 참관인들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선언하기를 거부했다. 유럽 연합의 수석 참관인 알렉산더 그라프 람스도르프(Alexander Graf Lambsdorff)는 한 지역구에서 자신의 감시단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중에 발표한 수치보다 25,000표 낮은 키바키의 공식 결과를 목격했다고 언급하며 발표된 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전에 "구식 신사"로 여겨졌던 키바키는 결과가 크게 의문시되는 매우 치열한 선거에서 승자로 발표된 지 한 시간 이내에 스스로 취임 선서를 하면서 "강인한 면모"를 드러냈다고 보도되었다. 오딩가의 지지자들은 그가 월요일에 라이벌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 선언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 행사를 금지했다. 현지 감시 단체인 민주주의 교육 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in Democracy)의 대표인 코키 물리(Koki Muli)는 이 날을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자 "쿠데타"라고 불렀다.
야당 지지자들은 이번 결과를 케냐 최대 부족인 키바키의 키쿠유족이 어떤 수단으로든 권력을 유지하려는 음모로 보았다. 선거에서 패배한 부족들은 정치적 권력 없이 5년을 보낼 가능성에 분노했으며, 반키쿠유 감정이 고조되어 2007-2008년 케냐 위기를 촉발했다. ODM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승리"가 "도둑맞았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후 표적이 된 키쿠유족이 보복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불안이 확산되자 TV와 라디오 방송국은 모든 생방송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광범위한 절도, 기물 파손, 약탈, 재산 파괴, 그리고 상당수의 잔학 행위, 살인, 성폭력이 보고되었다.
폭력은 두 달 이상 지속되었고, 키바키는 자신이 임명한 "반쪽" 내각으로 통치했으며, 오딩가와 ODM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2007년 선거가 결국 요한 크리그러(Johann Kriegler) 판사가 이끄는 독립 검토 위원회(IREC)에 의해 조사되었을 때,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했는지 단정적으로 확립하기에는 모든 경쟁 당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너무 많은 선거 부정 행위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정 행위에는 양측의 광범위한 뇌물 수수, 표 매수, 협박, 투표 조작뿐만 아니라, 이후 새 의회에 의해 해체된 케냐 선거 관리 위원회(Electoral Commission of Kenya, ECK)의 무능도 포함되었다.
3.6. 국민 화합 협정 및 대연립 정부
케냐는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아프리카 연합, 미국, 영국의 지원을 받아 "저명한 아프리카 인사들"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중재에 나서면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재에 따라 2008년 2월 라이라 오딩가와 키바키(현재는 "두 주역"으로 불림) 사이에 '국민 화합 협정(National Accord)'이라는 합의가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나중에 케냐 의회에서 2008년 국민 화합 및 화해법으로 통과되었으며, 키바키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라이라 오딩가는 새로 재설정된 총리직을 맡는 권력 분담을 규정했다.
2008년 4월 17일, 라이라 오딩가는 케냐의 역대 최대 규모인 42명의 장관과 50명의 차관으로 구성된 권력 분담 내각과 함께 총리로 취임했다. 내각은 키바키가 임명한 장관 50%와 라이라가 임명한 장관 50%로 구성되었으며, 실제로는 세심하게 균형 잡힌 민족적 연립 정부였다. 칼론조 무스요카가 부통령으로 포함된 이 합의는 "대연립 정부(Grand Coalition Government)"로 알려졌다.
3.7. 경제적 성과 및 유산
키바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주요 목표는 다니엘 아랍 모이 재임 기간 동안의 오랜 침체와 경제적 실정 이후 국가를 회복시키고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했는데, 냐요 시대(모이 대통령 재임 기간)의 여파, 서구 기부자들의 지원 감소, 키바키의 첫 임기 동안의 건강 문제, NARC 연합 해체로 인한 정치적 긴장, 2007-2008년 선거 후 폭력 사태,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두 번째 임기 동안 연정 파트너인 라이라 오딩가와의 불안정한 관계 등이 그러했다.
1970년대 재무부 장관으로서의 뛰어난 업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 키바키 대통령은 전임자 모이 대통령의 24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국가 경제에 가해진 손상을 복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모이 시대에 비해 키바키 재임 기간 동안 케냐는 훨씬 더 유능한 공공 부문 인사들에 의해 훨씬 더 잘 운영되었고 크게 변화했다.
키바키 재임 기간 동안 케냐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GDP 성장률은 2002년 최저 0.6%에서 2003년 3%, 2004년 4.9%, 2005년 5.8%, 2006년 6%, 2007년 7%로 상승했다. 이후 선거 후 혼란과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2008년(1.7%)과 2009년(2.6%)에 주춤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5%로 회복되었다.
과거 소외되고 largely 미개발 상태였던 반건조 또는 건조한 북부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개발이 재개되었다. 2003년 이전 완전히 붕괴되었던 많은 경제 부문이 회복되었다. 모이 재임 기간 동안 붕괴되었던 수많은 국영 기업들이 부활하여 수익성을 내기 시작했다. 통신 부문은 호황을 누렸다. 티카 고속도로와 같은 여러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등 인프라 재건, 현대화 및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모이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다. 케냐의 도시들도 긍정적으로 재정비되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키바키 정권은 또한 서구 원조에 대한 케냐의 의존도를 줄였으며, 세수 증가와 같은 내부적으로 생성된 자원을 통해 국가 재정이 점점 더 충당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그리고 다른 비서구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키바키 재임 기간 동안 현저히 개선되고 확장되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의 호랑이들, 브라질, 중동,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심지어 이란도 점점 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
3.8. 정치적 유산 및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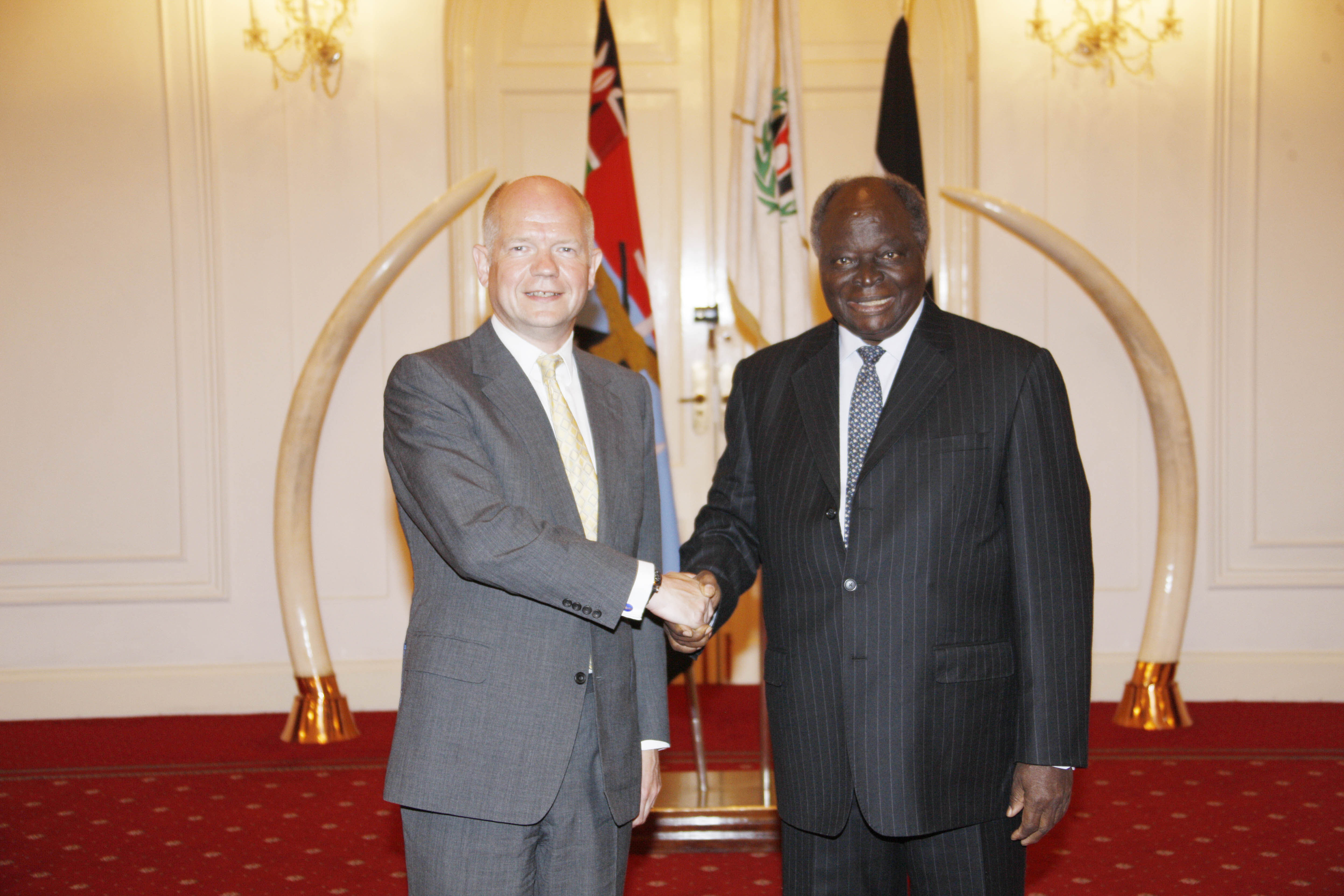
키바키 대통령은 주로 조모 케냐타 시대에 부상한 교육받은 키쿠유족 엘리트층, 즉 '주방 내각(Kitchen Cabinet)' 또는 '케냐산 마피아'라고 불리는 소수의 고령 동료들과 함께 통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그의 재임 기간은 키쿠유족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인식은 대통령이 2002년 선거 전 라이라 오딩가가 이끄는 자유민주당과의 양해각서를 파기한 것으로 보였을 때 더욱 강화되었고, 2007년 논란이 많았던 선거에서 라이라 오딩가가 이끄는 ODM당에 대한 그의 승리가 인구가 많은 키쿠유족, 메루족, 엠부족 공동체의 거의 전적인 득표로 달성되었을 때 더욱 심화되었다.
선거 후 폭력 조사 위원회(CIPEV)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2008년 초의 선거 후 폭력은 부분적으로 키바키 대통령과 그의 첫 정부가 국가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여론조사에서 그와의 문명화된 경쟁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정당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키바키 정권은 국가를 통합하지 못했고, 소외감이 선거 후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방치했다. 그와 당시 정부는 대다수 키쿠유 공동체로부터 어떤 선거에서든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주했으며, 다른 공동체들의 합법적인 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비판론자들은 키바키 대통령이 2002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 주로 민족적 이익에 따라 동원되는 정치를 고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비판론자는 "우리가 성취하고 새로운 세상이 밝았을 때, 늙은이들이 다시 나타나 우리가 이룬 승리를 자신들이 알던 옛 세상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말했다. 2002년 개혁 공약으로 당선된 키바키는 현상 유지(status quo ante)를 재확립한 것으로 비쳤다. 그의 반대자들은 그의 대통령직의 주요 목표가 그가 속해 있던 케냐타 시대에 등장한 엘리트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요약하면, 키바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케냐의 부족주의 문제 해결에는 거의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호사 조지 케고로(George Kegoro)는 2013년 4월 12일 데일리 네이션 신문에 실린 기사에서 키바키의 정치적 유산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키바키는 그 이전의 모이보다 훨씬 더 경제를 잘 관리했다. 그는 공공 업무 관리에 질서를 가져왔는데, 이는 모이 정권의 다소 비공식적인 스타일과는 다른 것이었다. 키바키의 무상 초등 교육 추진은 중요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며, 모이 시대에 망가졌던 케냐 축산 위원회(Kenya Meat Commission)와 케냐 협동조합 낙농(Kenya Cooperative Creameries)과 같은 주요 경제 기관의 부활도 그러할 것이다. ... 그러나 키바키가 모든 면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반부패 공약으로 집권했지만, 그는 골든버그 스캔들(Goldenberg scandal)에 대한 보시레 위원회(Bosire Commission)와 불법 토지 할당을 조사한 은둥구 위원회(Ndung'u Commission)라는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행되지 않았다. 또한 키바키 행정부는 그의 측근들과 관련된 앵글로 리싱 스캔들(Anglo Leasing scam)이라는 자체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다. 키바키가 반부패 총괄 책임자로 영감을 받아 임명한 존 기통고(John Githongo)는 2005년 대통령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서 사임했다. 따라서 그가 퇴임할 때에도 부패 척결이라는 과제는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다. ... 그러나 아마도 키바키 재임 기간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측면은 당시 고위 정치인들, 특히 라이라 오딩가와 칼론조 무스요카와의 관계일 것이다. 이 복잡한 관계의 배경에는 2007년 선거 후 폭력이 있으며, 그 뿌리는 2002년 키바키와 라이라 사이의 무효화된 양해각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해각서를 둘러싼 갈등은 직접적으로 나르크(Narc) 정부의 붕괴로 이어졌고, 그 후 키바키는 오딩가를 내쫓고 야당을 초대하여 함께 통치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선거에서 거부당했던 야당은 정부에 합류했고, 정당하게 당선되었던 라이라의 파벌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 라이라와 칼론조 지지자들에게 키바키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3.9. 부패 문제
키바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부패 혐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모이와 케냐타 시대에 만연했던 공공 토지 강탈을 사실상 종식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케냐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패 문화를 적절히 억제하지 못했다.
작가 미셸라 롱(Michela Wrong)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평균적인 케냐인이 매주 배불뚝이 경찰관과 지역 의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사소한 뇌물, 공무원과 정치인이 엄격히 부족주의적 노선에 따라 나눠주는 일자리, 또는 국가의 지배 엘리트가 저지르는 대규모 사기 등 부패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케냐인들이 '먹는 것'이라고 불렀던, 권력과 유착된 자들이 국가 자원을 탐욕스럽게 삼키는 행위는 국가를 마비시켰다. 반부패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작성한 부패 지수에서 케냐는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보다 약간 덜 지저분한 것으로 간주되며 항상 하위권을 맴돌았다..."
데일리 네이션은 2013년 3월 4일 "음와이 키바키의 10년, 영광과 오명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2002년 반부패를 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집권한 지도자로서, 키바키 재임 기간 동안 수억 실링의 공공 자금이 빼돌려진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다니엘 아랍 모이의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벗어나 집권한 키바키의 국민무지개연합은 변화와 경제 성장을 약속하며 환영받았지만, 곧 기존의 관행을 따르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냐의 전 반부패 책임자 존 기통고는 미셸라 롱의 책 우리가 먹을 차례다(It's Our Turn to Eat)에서 '초기 부패 대응은 매우 강력했지만... 잠시 후 이러한 사기 사건들이 대통령 자신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수많은 부패 스캔들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수십억 실링 규모의 앵글로 리싱 스캔들로, 2004년에 드러났으며 해군 함정 및 여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명목으로 복잡한 해외 기업 네트워크에 공공 자금이 지불되었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3.10. 2010년 헌법 제정
키바키 대통령이 2010년 2010년 케냐 헌법 국민투표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통과시킨 케냐의 변혁적인 2010년 헌법 제정은 케냐의 거버넌스와 제도적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한 중요한 승리이자 성과였다. 새로운 헌법과 함께 광범위한 제도적, 입법적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키바키 대통령은 그의 재임 마지막 해에 이를 능숙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키바키의 아들 지미는 "그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새로운 헌법의 공포였다... 그것은 그에게 매우 깊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3.11. 권력 이양
키바키는 2013년 4월 9일 케냐 최대 경기장에서 열린 공개 취임식에서 후임자 우후루 케냐타에게 케냐 대통령직을 이양했다。 키바키는 "나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의 횃불을 넘겨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임 기간 내내 자신을 지지해 준 가족과 모든 케냐 국민에게 감사하며, 그의 정부가 이룬 다양한 업적을 언급했다. 이 권력 이양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과 50년간의 공직 생활의 끝을 의미했다.
4. 사생활

키바키는 1961년부터 2016년 루시가 사망할 때까지 루시 무토니(Lucy Muthoni)와 결혼했다. 그들은 주디 완지쿠(Judy Wanjiku), 지미 키바키(Jimmy Kibaki), 데이비드 카가이(David Kagai), 토니 기틴지(Tony Githinji) 등 네 자녀를 두었다. 그들에게는 또한 조이 제이미 마리(Joy Jamie Marie), 레이첼 무토니(Rachael Muthoni), 음와이 주니어(Mwai Junior), 크리스티나 무토니(Krystinaa Muthoni) 등 여러 손주들이 있었다. 지미 키바키는 아버지의 정치적 후계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포부를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2004년 언론은 키바키가 관습법에 따라 결혼한 두 번째 배우자 메리 웜부이(Mary Wambui)와 딸 완기 음와이(Wangui Mwai)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궁은 당시 키바키의 유일한 직계 가족은 부인 루시와 네 자녀뿐이라는 서명 없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9년 키바키는 루시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아내는 한 명뿐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키바키의 내연녀 의혹과 그의 아내의 유난히 극적인 공개적 반응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당황스러운 부차적인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이 모든 스캔들을 "케냐의 새로운 드라마"라고 칭했다.
키바키 대통령 시절 대통령 배우자의 특권을 누리고 강력하고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던 웜부이 여사는 루시를 종종 대중 앞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키바키의 아들 지미가 공개적으로 주도한 키바키 가문의 반대와 키바키의 상대 후보 지지 및 선거 운동에도 불구하고, 웜부이는 2013년 총선에서 키바키의 뒤를 이어 오타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14년 12월, 보니 칼왈레(Bonny Khalwale) 상원의원은 KTN의 제프 코이난지 라이브(Jeff Koinange Live)에서 키바키 대통령이 웜부이를 자신의 아내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키바키는 골프를 즐겼으며 무타이가 골프 클럽(Muthaiga Golf Club)의 회원이었다. 그는 독실한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였으며 매주 일요일 정오 나이로비에 있는 콘솔라타 신사 가톨릭교회(Consolata Shrines Catholic Church)에 참석했다.
2016년 8월 21일, 키바키는 카렌 병원(Karen Hospital)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전문 치료를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향했다. 케냐타 가문이나 모이 가문과는 달리, 키바키의 가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라이키피아현 주지사를 지낸 그의 조카 은데리투 무리이티(Nderitu Muriithi)를 제외하고는 정치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5. 사망
키바키는 2022년 4월 21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사망은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케냐타 대통령은 키바키 대통령에게 최고 시민 및 군사 예우를 갖춘 국장이 거행될 것이며, 키바키 대통령이 안장될 때까지 국기를 조기 게양하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25일, 그의 시신은 국장의 일환으로 군용 포차에 실려 의회 건물로 운구되어 안치되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영부인 마가렛 케냐타는 케냐 국민들과 함께 조문했다. 그의 시신은 연단에 안치되었고, 그의 대통령 표준기 색상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가 즐겨 입던 핀스트라이프 정장을 입고 있었다. 또한 케냐 방위군 대령 네 명이 두 시간마다 교대하며 시신을 경비했다. 안치 기간은 2022년 4월 27일까지 이어졌으며, 4월 29일 냐요 국립 경기장(Nyayo National Stadium)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여러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는 마침내 2022년 4월 30일 가톨릭교회의 장례 미사 후 니에리현 오타야 자택에 안장되었으며, 완전한 군사 예우가 뒤따랐다. 예우에는 라스트 포스트와 롱 리빌리(Long Reveille) 나팔 소리, 19발의 조총 발사, 그리고 미싱 맨 포메이션(Missing Man formation) 공중 비행이 포함되었다. 남수단은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으며, 탄자니아는 2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6. 영예 및 수상
- 케냐 황금 심장 훈장 1등급 (Chief of the Order of the Golden Heart of Kenya, C.G.H.)
6.1. 명예 학위
7. 역대 선거 결과
| 선거명 | 직책명 | 대수 | 정당 | 득표율 | 득표수 | 결과 | 당락 |
|---|---|---|---|---|---|---|---|
| 1992년 선거 | 케냐 대통령 | 2대 | 민주당 | 19.45% | 1,050,617표 | 3위 | 낙선 |
| 1997년 선거 | 케냐 대통령 | 2대 | 민주당 | 30.89% | 1,911,742표 | 2위 | 낙선 |
| 2002년 선거 | 케냐 대통령 | 3대 | 국가무지개연합 | 62.20% | 3,646,277표 | 1위 | 당선 |
| 2007년 선거 | 케냐 대통령 | 3대 | 국민통합당 | 46.42% | 4,584,721표 | 1위 | 당선 |
8. 평가 및 유산
음와이 키바키는 케냐의 독립 이후 40년간 지속된 KANU의 일당 통치를 종식시킨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케냐는 경제 회복과 인프라 발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무상 초등 교육 도입은 교육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여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학교 교육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는 빌 클린턴과 같은 국제 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케냐 비전 2030의 수립과 티카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서구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중국, 일본 등 비서구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추구했다. 2010년 새 헌법의 제정은 케냐의 거버넌스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키바키의 정치적 유산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대통령 취임 전 야당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2007년 대선에서는 선거 조작 논란에 휩싸여 전국적인 폭력 사태를 야기했다. 이 사태는 부족주의를 심화시키고 국가적 통합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거 후 폭력 조사 위원회(CIPEV)는 키바키 정부가 부족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부패 혐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정부 내에서 앵글로 리싱 스캔들과 같은 대규모 부패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가 임명한 반부패 책임자가 대통령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사임하는 등 부패 척결 노력에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키바키는 경제 관리자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공공 서비스 질서 확립에 기여했지만, 정치적 약속 불이행과 부족주의 심화 문제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주요 비판점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