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애
긴다이치 교스케는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서 태어나 평생에 걸쳐 언어학, 특히 아이누어 연구에 헌신했다. 그의 삶은 학문적 열정과 개인적인 시련이 교차하는 과정이었다.
1.1. 유년기와 교육
긴다이치 교스케는 1882년(메이지明治일본어 15년) 5월 5일, 모리오카시 요쓰야 정에 있는 금전일 구메노스케(金田一久米之助)와 야스(ヤス)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상업 때문에 교토로 올라가 있는 동안 태어났기 때문에 '교스케'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는 1명의 누나, 6명의 남동생, 3명의 여동생을 포함한 11남매 중 장남이었다. 금전일 가문은 교스케의 증조부 이헤에 가쓰즈미(伊兵衛勝澄)가 미곡상으로 대를 이어 재산을 모았고, 대기근 시기에는 창고를 열어 마을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하며 난부 번의 사족에 봉해진 명문가였다. 농가 출신인 그의 아버지 구메노스케는 글을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능숙하고 총명한 재능을 인정받아 야스의 데릴사위로 들어왔으나, 장사 수완이 부족하여 맡은 사업마다 실패했다. 그러나 금전일 가문의 당주이자 백부인 긴다이치 가쓰사다(야스의 큰오빠)의 도움으로 교스케는 가난을 모르고 성장했다. 6명의 남동생 모두 도쿄 제국대학에 진학했다.
구메노스케는 자녀들을 잠자리에 들 때 『겐페이 성쇠기』나 『헤이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었다. 교스케는 점차 금전일 본가의 문고에 드나들며 『삼국지』, 『사기평림』, 『항우본기』 등을 탐독하게 되었다. 그는 이와테현립 모리오카 심상중학교(재학 중 이와테현립 모리오카 중학교로 개칭, 현 이와테현립 모리오카 제일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동창으로는 오이카와 고시로와 노무라 고도가 있었다. 모리오카 중학교 시절, 집 램프에서 인화된 작은 불을 끄려다가 손을 다쳐 중지와 약지가 굽혀지지 않게 되면서, 잘했던 그림을 포기하고 문학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 그는 시마자키 도손의 『젊은 풀밭』(若菜集)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바이리카메이'(梅里花明)라는 필명으로 문예 잡지에 시를 투고하여 교내에서는 '긴다이치 카메이'라고 불렸다. 1900년 4월 『묘조』가 창간되었을 때, 다른 잡지에 투고했던 그의 노래가 (그 잡지의 선정자였던 요사노 텟칸에 의해) 전재되었다. 이를 계기로 교스케는 『묘조』의 발행처인 신시사(新詩社)의 동인이 되었고, 그 후에도 『묘조』에 단가를 발표했다. 1901년 1월경 오이카와 고시로로부터 "단가를 지망하는 후배"로 이시카와 다쿠보쿠를 소개받았고, 교스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묘조』 전권을 다쿠보쿠에게 빌려주었다. 이후 다쿠보쿠와는 단가 회람지 『백양』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1898년도(3학년) 당시 그는 전교 17명의 특대생 중 한 명이었으며, 같은 학년의 학업 성적 평균은 86점이었다.
당시 그는 몸집이 작아 유도 연습에서도 낮에는 대련을 피하고 주로 아침 훈련에만 모습을 드러내려 했다. 마찬가지로 아침 훈련에 오던 2년 선배인 요나이 미쓰마사와 함께 유도 훈련을 하게 되었다. 체격이 큰 요나이가 작은 교스케의 기술에 큰 소리를 내며 넘어지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교스케는 실력 차이를 깨닫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1.2. 초기 활동과 아이누어 연구 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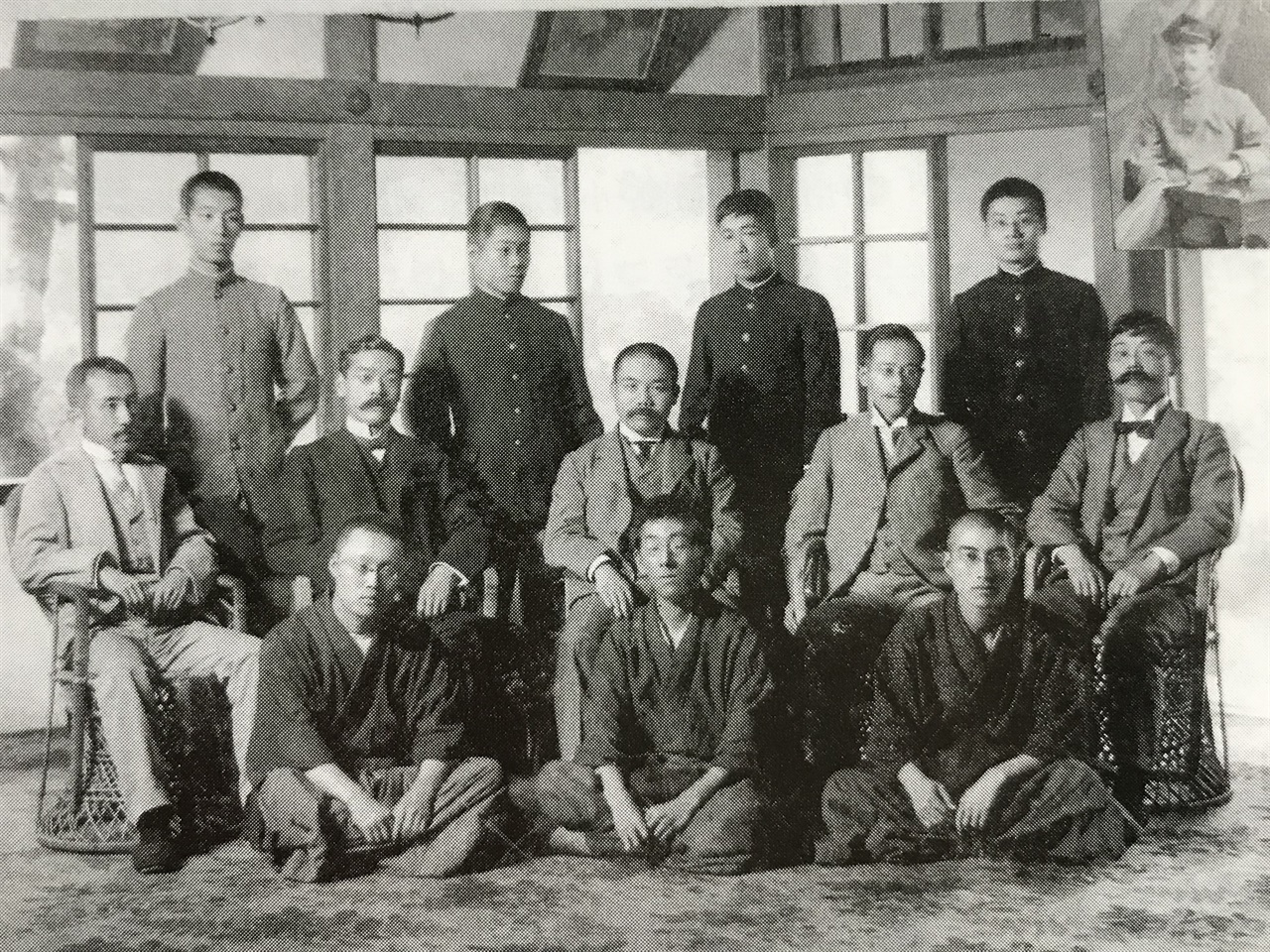
제2고등학교를 거쳐 1904년(메이지明治일본어 37년) 9월 도쿄 제국대학 문과대학에 입학하여 도쿄로 상경했다. 니이무라 이즈루와 우에다 만넨의 강의에 매료되어 언어학과에 진학했다. 1년 선배로는 하시모토 신키치, 오구라 신페이, 이하 후유가 있었다. 오구라는 한국어를, 이하는 류큐어를 연구했지만, 아이누어는 일본인 연구자가 없었고 영국인 선교사 존 배첼러에 의해 아이누어 사전이 출판되어 있었다. 우에다로부터 "아이누어 연구는 일본 학자들의 사명이다"라는 말을 듣고, 도호쿠 출신인 교스케는 아이누어를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1906년(메이지明治일본어 39년) 처음으로 홋카이도에 건너가 아이누어 자료를 수집했다. 여비 70 JPY는 백부 가쓰사다가 내주었다. 이 조사에서 교스케는 연구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1907년(메이지明治일본어 40년) 사할린의 오초포카에서 사할린 아이누어를 조사했다. 아이누 어린이들을 통해 사할린 아이누어를 배우는 에피소드는 이때의 일화로, 후에 수필 『마음의 작은 길』(心の小径)로 유명해졌다. 여비는 가쓰사다로부터 100 JPY, 우에다로부터 100 JPY 등 총 200 JPY에 달하는 거액을 사용했지만, 40일간의 체류 동안 문법과 4,000개의 어휘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후 교스케는 생활 걱정이라는 망설임을 끊고 아이누어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조사 보고서를 우에다에게 제출한 10월에는 이미 대학 졸업식이 끝나 있었다.
1908년(메이지明治일본어 41년) 4월 가이조 중학교에 국어 교사로 취직했다. 그 달 말, 하숙집 '세키신칸'에 이시카와 다쿠보쿠가 굴러들어왔다. 교스케는 다쿠보쿠에게 돈을 빌려주고 두 사람 몫의 하숙비 30 JPY를 지불했지만, 8월에 수중에 돈이 없어 하숙집 여주인에게 지불을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화가 난 교스케는 수레 두 대 분량의 장서를 팔아 30 JPY를 마련해 하숙비를 지불하고, 9월 초 다쿠보쿠와 함께 다른 하숙집 '가이헤이칸'으로 이사했다. 10월, 언어학과 출신인 교스케에게 교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실직했다. 은사인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소개로 산세이도에 취직했고, 고쿠가쿠인 대학의 비상근 강사가 되었다. 다쿠보쿠도 이듬해 3월 도쿄 아사히 신문사의 교정계로 채용되어 도쿄로 올라온 처자식과 함께 이사했다.
1909년(메이지明治일본어 42년), 27세의 교스케는 20세의 하야시 시즈에와 결혼했다. 결혼을 소개한 것은 다쿠보쿠로, "문학사이고 대학 강사이며, 고향에서는 삼촌이 모리오카 은행의 은행장"이라고 선전하며 혼담을 진행시켰다. 교스케는 결혼한다면 고향 여자가 아닌 표준어를 쓰는 혼고 근처의 아가씨를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혼고 출신 시즈에에게 마음이 움직였다. 12월 28일 결혼식을 올리고 하코네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모리오카의 가쓰사다 집에서 피로연을 열었지만, 도쿄 출신인 시즈에는 모리오카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골을 싫어하게 되었다. 게다가 다쿠보쿠가 자주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즈에는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스케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시즈에는 마침내 "자신과 다쿠보쿠 중 누가 더 소중한가"라며 불평했고, 교스케는 다쿠보쿠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1910년 다쿠보쿠의 장남 신이치가 태어난 지 24일 만에 사망했을 때, 다쿠보쿠는 교스케에게 장례식을 위해 상복을 빌려달라고 엽서를 보냈지만 교스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조문도 조의금도 내지 않았다. 게다가 그 직후 출간된 『한 움큼의 모래』에서는 헌정사에 이름이 언급되며 감사의 뜻이 표해지고 헌정본도 보내졌지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911년(메이지明治일본어 44년) 7월, 이미 병상에 있던 다쿠보쿠는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지팡이를 짚고 교스케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것이 다쿠보쿠의 "마지막 방문"이 되었다.
1912년(메이지明治일본어 45년) 1월, 장녀 이쿠코가 만 1세를 20일 앞두고 사망했으며, 이에 대해 다쿠보쿠가 보낸 애도의 엽서가 교스케에게 보낸 마지막 서한이 되었다. 3월 30일, 다쿠보쿠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요미우리 신문 기사(도키 젠마로가 집필)로 알게 된 교스케는 예정된 꽃놀이를 취소하고 첫 출판작 『신언어학』("A History Of Th Language" 번역, 6월 출간)의 원고료 절반인 10 JPY를 들고 달려갔고, 다쿠보쿠와 그의 아내 세쓰코는 그의 호의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4월 13일 이른 아침, 다쿠보쿠가 위독해지자 세쓰코는 인력거로 교스케를 불렀지만, 곧 다쿠보쿠가 의식을 회복하고 대화까지 하자 "괜찮다"고 안심한 교스케는 고쿠가쿠인 대학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그 직후 다쿠보쿠는 사망했고, 강의를 마친 후 다쿠보쿠의 집으로 돌아온 교스케는 다쿠보쿠의 시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다쿠보쿠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되어 친가에서 아버지 위독 소식이 들어와 교스케는 귀향했다.
같은 해, 9월 26일, 아버지 구메노스케가 사망했다. 구메노스케는 사업 실패로 빚이 늘어나 본가의 양자인 긴다이치 고쿠시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가옥과 부지를 빼앗겨 일가족은 본가의 행랑채에서 살게 되었다. 도쿄 병원에 입원한 구메노스케를 문병한 교스케는 "나는 너에게 밥 한 톨 먹여준 적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고, 아버지의 죽음 후 돈이 되지 않는 아이누어 연구를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희생시킨 연구를 어중간하게 할 수 없다고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9월 산세이도가 도산하면서 교스케는 다시 실직하게 되었다.
1.3. 아이누어 연구와 주요 업적
10월, 도쿄 우에노 공원에서 식민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교스케는 방문객들에게 일본의 소수민족 인사말과 일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가했던 사할린 아이누인들에게 청취 조사를 실시하여 사할린에서 채집한 유카르 "하우키" 등에 역주를 붙일 수 있었다. 여기서 그는 히다카의 시운코쓰(紫雲古津) 마을의 나베사와 고포아누(鍋沢コポアヌ)로부터 유카르 중에서도 장대한 "호장환의 곡"(虎杖丸の曲, 쿠즈네시리카, 쿠트네시리카)의 존재와 그것을 부를 수 있는 맹인 유카르 명인 와카루파에 대해 들었다. 교스케가 우에다 만넨에게 상담하자 우에다는 사비로 여비를 내주었다. 1913년(다이쇼大正일본어 2년) 7월, 교스케는 와카루파를 도쿄로 초청했다. 약 한 달간의 체류 기간 동안 14편의 2만 행에 달하는 시가와 10권 1천 페이지에 달하는 구술을 필사했지만, 와카루파의 고향에서 장티푸스가 발생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은 와카루파는 8월 말 귀향했다. 와카루파는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기도를 드린 후 장티푸스로 쓰러져 12월 7일에 사망했다. 교스케가 그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연초였다.
한편, 1912년에는 시라세 노부의 남극 탐험에 참가했던 사할린 아이누인 야마베 야스노스케(이전부터 교스케와 면식이 있었다)가 귀국했을 때, 야마베의 구술하는 반생을 필기 번역하여 이듬해 1913년 『아이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쿠분칸에서 출간했다(상하 2분책).
1918년(다이쇼大正일본어 7년) 홋카이도 조사 여행 중 가네나리 마쓰의 집에서 지리 유키에를 알게 되었다. "유카르는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묻는 유키에에게 교스케는 귀중한 문학이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아이누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유키에를 여학교 졸업 후 도쿄로 부를 생각으로, 노트를 보내 유카르를 로마자로 필사할 것을 권유했다. 유키에는 지병인 심장병이 좋지 않았지만, 1922년(다이쇼大正일본어 11년) 5월 도쿄로 상경하여 교스케의 집에 머물렀다. 유키에의 노트를 바탕으로 『아이누 신요집』(アイヌ神謡集) 출판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교스케는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누어 문법을 유키에에게 해설해 달라고 요청하며 그녀의 "뛰어난 두뇌와 어학 천재성", "천사 같은 여성"을 극찬했다. 이 무렵 교스케의 아내 시즈에는 생활고와 연이은 자녀들의 죽음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넷째 딸 와카바를 유키에가 돌보기도 했다. 시즈에의 언니가 그녀를 데리고 이혼시키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교스케는 "말도 안 된다. 내가 맞이한 아내다"라고 일축하며 아내에 대한 염려는 없었다. 유키에는 『아이누 신요집』을 완성하고 9월 18일, 19세 3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1923년(다이쇼大正일본어 12년) 눅키베쓰의 유카르 명인 구로카와 쓰나레를 방문했다. 사망한 와카루파는 "호장환의 곡"은 도중까지만 알고 있으니 구로카와 쓰나레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남겼었다. 그러나 쓰나레는 위독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가족으로부터 면회를 거절당했다. 교스케는 여러 번 부탁하여 병문안만 허락받았다. 쓰나레와 대면한 교스케는 아이누어로 쓰나레를 칭찬하는 인사를 건네자, 쓰나레는 천장에 매달린 띠를 붙잡고 몸을 일으켜 "호장환의 곡"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고 가며 유카르를 이야기하는 쓰나레의 곁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런 것을 쓰나레의 유카르로 세상에 남기면 부끄럽다"며 교스케의 필기를 막으려 했지만, 쓰나레는 손을 흔들며 기록해 달라고 말했다. 쓰나레에 의해 와카루파의 "호장환의 곡"이 중간이 아니라 완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교스케의 강압적인 방식은 후에 엄격하게 비판받았다.
1931년(쇼와昭和일본어 6년), 교스케 평생의 대작 『유카르의 연구: 아이누 서사시』 I·II가 출간되었다. 교스케의 만년 수필 『내가 걸어온 길』(私の歩いてきた道)에서는 "오카쇼인(岡書院)의 오카 시게오에게 거듭 부탁받아 1930년(쇼와 5년) 집필, 1931년(쇼와 6년) 출판, 1932년(쇼와 7년) 온시상을 수상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오카가 만년에 쓴 회고록 『서점 풍정』(本屋風情)에 수록된 "『아이누 서사시 유카르의 연구』 탄생 실록"에서는 다른 사정이 적혀 있다. 처음에는 교스케가 그동안의 유카르 연구를 영문 박사 논문으로 도쿄 제국대학에 제출했지만, 심사 적임자가 없는 채 대학 부속도서관에 보관되던 중 간토 대지진으로 소실되었다. 이를 아쉬워한 야나기타 쿠니오는 친하게 지내던 오카 시게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오카는 지진 후 가건물에 살던 교스케를 방문했다. 오카의 격려와 협력으로 교스케가 일본어로 새로 써 내려갔다. 오카의 알선으로 시부사와 게이조로부터 매달 50 JPY가, 출판 시에는 동양문고로부터도 연구비가 교스케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이렇게 2권 합쳐 1458페이지의 대작이 완성되었다. 오카는 앞서 언급한 『서점 풍정』에서 교스케가 야나기타와 시부사와의 배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담담하게 서술한 것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썼다.
1930년(쇼와昭和일본어 5년) 유키에의 남동생 지리 마시호가 교스케를 의지하여 도쿄로 상경, 이치고에 입학했다. 그 후 도쿄대 언어학과를 졸업하여 구보데라 이츠히코에 이어 교스케의 아이누어 연구의 두 번째 제자가 되었다.
1943년에 출간된 『명해국어사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겐보 고키는 『사전을 만들다』(辞書をつくる, 타마가와 선서)에서 "교스케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 세상에 나와 있는 국어사전은 열 손가락이 넘는다. 그 대부분은 선생님의 인품을 이용하여 단순히 이름만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중에서도 마지막 한 줄까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며 책임을 나눈 것은 『명해국어사전』뿐이다"라고 썼다. 그러나 거의 겐보의 독력으로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직 도쿄 제국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이름으로 사전을 낼 수는 없었기에, 산세이도에 겐보를 소개해 준 교스케의 이름을 빌리게 되었다. 교스케의 장남이자 역시 언어학자인 긴다이치 하루히코에 따르면, '긴다이치 교스케 편'이라고 명시된 사전은 많지만, 이름을 빌려준 것일 뿐 실제로는 거의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교스케는 일본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도쿄가 공습을 받기 시작하자, 결혼하여 집을 떠난 장남 하루히코는 피난을 권했고, 핫토리 시로가 마련한 오쿠타마의 방에 시즈에와 와카바, 그리고 장서를 맡겼다. 다행히 교스케의 집은 공습으로 불타지 않았고, 종전 후 세 사람의 생활이 돌아왔지만 1949년(쇼와昭和일본어 24년) 12월 24일, 와카바는 타마가와 상수로에서 자살했다. 와카바는 전년도에 결혼했지만, 몸이 약해 살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물에 몸을 던졌다.
1.4. 말년과 사망
전후, 산세이도(三省堂)는 새로운 교과서 지정에 맞춰 국어 교과서를 만들면서, 교스케와 하루히코 부자에게 집필을 의뢰했다. 산세이도 『중등국어 긴다이치 교스케 편』, 소위 『중긴』은 발간 이후 10여 년에 걸쳐 채택 수 1위를 기록하며 국어 교과서의 대표가 되었다.
만년의 교스케는 가네나리 마쓰 등이 필록한 유카르 노트의 일본어 번역 주석 작업에 전념했다. 이들은 1959년(쇼와昭和일본어 34년)부터 『아이누 서사시 유카르집』(アイヌ叙事詩ユーカラ集)으로 간행되었다. (9권의 번역 주석 중 사망)
1969년(쇼와昭和일본어 44년) 하루히코가 구입한 혼고의 맨션으로 이사했다. 1971년(쇼와昭和일본어 46년) 8월경부터 병상에 눕는 일이 잦아졌고, 11월 7일 아침 용태가 악화되었다. 11월 14일 오후 8시 30분, 노쇠로 인한 동맥경화증과 기관지 폐렴으로 영면했다. 향년 90세(만 89세). 15일 기후쿠지에서 빈소가 차려졌고, 16일 밀장이 거행되었다. 23일 아오야마 장의장에서 산세이도의 회사장으로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장례위원장은 가메이 가나메 사장이 맡았고, 다카미 사부로 문부대신, 난바라 시게루 일본학사원 원장 등이 고인의 공적을 기리는 조사를 낭독했으며, 대학, 언론, 배우, 정치인 등 각계각층에서 조화가 이어지는 등 학자의 장례식으로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교스케의 서거 시에는 쇼와 천황으로부터 조의금인 제사료가 하사되었다.

2. 인물과 사상
긴다이치 교스케는 평생을 언어학 연구에 바치며 독특한 학문적 관점과 가치관을 형성했다. 그의 사상은 아이누어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일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시대적 한계와 논란의 여지를 품고 있다.
2.1. 아이누어 연구에 대한 관점
긴다이치는 평생 가난한 생활을 견디면서도 아이누어 연구에 일생을 바쳤다. 그의 손자 긴다이치 히데호는 2014년에 교스케가 없었다면 아이누어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아이누가 일본인보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가르침을 받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누는 위대한 민족이다", "당신들의 문화는 결코 열등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아이누인들을 대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동학(同学)의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서양 문학으로 들어가거나, 서양 철학이나 일본 철학 같은 높은 사상을 좇아 자신을 만들어갈 때, 나 혼자 야만인의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모두에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니 매우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긴다이치 교스케 『내가 걸어온 길』, 1997년 2월 25일, 52-55쪽)
"내가 혼자 미개인의 세계로 되돌아가, 몽매하고 저급한 문화 속에서 언제까지나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고 쓸쓸함이 밀려온다." (『나의 일』, 1954년)
또한 그는 아이누인들이 아이누어를 버리고 제국 일본의 언어인 일본어로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야스다 도시로는 2008년 저서 『긴다이치 교스케와 일본어의 근대』(金田一京助と日本語の近代)에서 이러한 교스케의 아이누와 아이누어에 대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교스케의 문하생이었던 지리 마시호는 후년에 교스케 등 일본인의 아이누어 연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스케 또한 지리의 저서 『아이누어 사전 식물편』이 아사히상 후보에 올랐을 때, 서두에서 홋카이도 대학의 식물학자들을 비판한 것을 이유로 추천을 거부했다. 지리는 "선생님은 나를 질투한다"고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나 속편인 『인간편』에서는 추천사를 썼다. 마시호는 1961년(쇼와昭和일본어 36년) 52세로 사망했다. 79세의 교스케는 비행기로 홋카이도까지 달려갔지만, 마시호가 죽으면 알려달라는 사람들의 메모 목록에는 교스케의 이름이 없었다.
쇼와 천황에게 아이누어에 대해 강연하게 되었을 때, 허용된 시간은 15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가까이 계속 이야기하여 교스케는 천황 앞에서 크게 당황하고 낙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천황은 며칠 후 열린 다회 자리에서 "지난번 이야기는 재미있었어"라고 위로했고, 교스케는 "황공하옵니다"라고 말한 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2.2. 이시카와 다쿠보쿠와의 관계

『이시카와 다쿠보쿠 전집』(石川啄木全集) 간행 시, 『로마자 일기』(ローマ字日記)에 다쿠보쿠와 함께 아사쿠사에 다니며 창기와 유흥을 즐겼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딸의 결혼에 지장이 있다"며 수록에 맹렬히 반대했다. 사실 교스케는 생전의 다쿠보쿠로부터 사후에 (『로마자 일기』를 포함한) 일기를 맡기는 것과, 읽고 태워버리는 것이 좋으면 소각할 것(그렇지 않으면 태우지 말 것)을 세 차례에 걸쳐 전달받았다. 그러나 다쿠보쿠의 장례 직후 부친의 위독으로 도쿄를 떠났고 일기는 다쿠보쿠의 아내 세쓰코의 손에 보관되었다. 세쓰코는 하코다테시에서 사망하기 직전에 미야자키 이쿠우에게 일기를 맡길 것을 이야기했고, 세쓰코 사망 후 이쿠우를 통해 하코다테 시립 중앙도서관에 기탁되었다.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1936년, 개조사가 일기를 공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마루야에게 전달했고, 마루야는 교스케와 도키 젠마로와 협의한 결과, 일기의 공개(이를 위해 일기를 하코다테 도서관에서 세 사람에게 분배) 및, 공개 후에 "고인 및 관계자 일동이 가장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하코다테 도서관장 오카다 겐조에게 보냈지만 이 요구는 무시되었다. 오카다 겐조는 3년 후인 1939년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일기를 공개하지도 소각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들은 교스케는 (오카다의 판단을) "별다른 이유는 없는 듯하다. 있는 것은 애장자 공통의 심리 지배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좋으리라. 그 기개가 그 일기를 소각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겉으로는 칭찬하면서도 실망감을 표했다. 오카다가 1944년에 사망하고 전후 이시카와 마사오(다쿠보쿠의 장녀 교코의 남편)가 일기 공개를 결단했을 때, 교스케에게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했고, 처음으로 일기를 읽은 교스케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삭제는 공평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참으면서, "너무 심하다"고 느낀 『로마자 일기』의 한 부분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폐가 된다"고 판단한 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시카와 마사오는 그것들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했다. 교스케는 『이시카와 다쿠보쿠 일기』 3권(세계평론사, 1949년)에 기고한 「다쿠보쿠 일기 끝에」에서 일기를 읽은 소감(그리움이나 기억과의 괴리 등)을 기록하며, 마지막에는 "그토록 가혹한 운명 아래, 운명을 저주하지 않고, 병고와 빈곤을 초월하여 새로운 내일의 이상을 그리고, 마지막에 잠이 들어 잠자리에 드는 듯한 조용한 대왕생을 하는 영원한 청년의 생생한 기록-다쿠보쿠 일지의 간행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여겨져야 할 것을 현대 문헌에 하나 새롭게 추가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맺었다.
교스케는 다쿠보쿠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다쿠보쿠의 만년에 "사상적 전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 이와키 노리노리가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교스케는 1961년 감정적인 반박을 발표하며 이와키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교스케가 논점을 "다쿠보쿠의 사상적 전환"이 아닌 "다쿠보쿠의 방문" 유무로 바꿈으로써 이와키는 논쟁을 중단했고, 사신을 보내 오해를 푼 뒤 1964년 교스케가 초대하는 형태로 만나 화해했다. 원래 이와키는 교스케의 저서 『이시카와 다쿠보쿠』에 영향을 받아 연구를 시작했고, 첫 자비 출판 논문을 교스케에게 보내면서 교류가 시작되었다. 교스케는 처음부터 이와키의 실증적인 연구를 높이 평가했다. 만남의 자리에서 교스케는 "부모 자식 간의 다툼과 같으니 신경 쓰지 마라"며 논쟁에 대해 잊고, 그 후에는 이와키와 이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다쿠보쿠의 "사상적 전환"설에 대해서는 이와키의 주장이 통설이 되었다.
2.3. 기타 일화
1907년(메이지明治일본어 40년) 사할린으로 건너간 교스케는 그동안 배웠던 홋카이도 아이누어가 현지 아이누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우연히 놀고 있던 아이들 앞에서 그림을 그렸더니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며 사할린 아이누어 단어를 말해주었다. 배운 단어를 어른들 앞에서 사용해 보자 모두 크게 기뻐하며 그때부터 교스케에게 친밀하게 언어를 가르쳐주었다. 이 일화는 1931년(쇼와昭和일본어 6년) 『한마디 말 할 때까지』(片言をいうまで, 『유카르의 사람들』 수록)와 전후 신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에세이 『마음의 작은 길』(心の小径)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제자 지리 마시호는 "사할린 아이누인들은 홋카이도에 온 적이 있으므로, 홋카이도 아이누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스케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여 말을 해주지 않았을 뿐,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는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고 변명했다.
그는 표준어 제정에 열성적이었으며, 국어심의회에서는 표준어 부회장을 맡았다. 자신의 발음에 대해서는 콤플렉스가 있었으며, 아들 하루히코는 교스케가 자신의 발음을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실망했다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도호쿠 지방 출신이지만, 요시쓰네 북행설과 요시쓰네=칭기즈칸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젊은 시절 거주지를 방문하고 친교를 맺었던 이 설의 신봉자 오야베 젠이치로를 잡지 『중앙사단』에서 "오야베 설은 주관적이며, 역사 논문은 객관적으로 논술되어야 하며, 이런 종류의 논문은 '신앙'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고온시 시마와타리 설화가 오래전부터 에조치에 전해졌던 것을 후에 일본인들이 아이누 전승으로 오해한 것이며, 오키쿠루미와 요시쓰네를 연결시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아이누 노인들의 이야기는 일본인을 의식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3. 저서 및 주요 저작
긴다이치 교스케는 아이누어 연구, 일본어 사전 편찬, 그리고 민족학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그의 저작들은 일본 언어학과 민족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3.1. 단독 저서
- 『북 해도 고요 유편』(北蝦夷古謡遺篇) 갑인총서간행소 (1914년)
- 『아이누의 연구』(アイヌの研究) 내외서방 (1925년)
- 『유카르의 연구 아이누 서사시』(ユーカラの研究 アイヌ叙事詩, 전2권) 동양문고 (1931년)
- 『국어 음운론』(国語音韻論) 도강서원 (1932년)
- 『아이누 문학』(アイヌ文学) 가와데쇼보 (1933년)
- 『언어 연구』(言語研究) 가와데쇼보 (1933년)
-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 문교각 (1934년), 이후 신편 가도카와 문고, 고단샤 문예문고
- 『북쪽 사람』(北の人) 아즈사쇼보 (1934년), 이후 가도카와 문고
- 『학창 수필』(学窓随筆) 인문서원 (1936년)
- 『유카르』(ゆうから, 수필) 쇼카샤 (1936년)
- 『채방 수필』(採訪随筆) 인문서원 (1937년)
- 『국어사 -계통편-』(国語史 -系統編-) 도강서원 (1938년)
- 『국어의 변천』(国語の変遷) 일본방송출판협회 (1941년), 이후 창원문고
- 『신 국문법』(新国文法) 도쿄 무사시노 서원 (1941년)
- 『국어 연구』(国語研究) 야구모서림 (1942년)
- 『유카르 개설 아이누 서사시』(ユーカラ概説 アイヌ叙事詩) 세이지샤 (1942년)
- 『언령을 둘러보고』(言霊をめぐりて) 야시마쇼보 (1944년)
- 『국어의 진로』(国語の進路) 교토 인쇄관 (1948년)
- 『국어의 변천』(国語の変遷) 도코협회출판부 (1948년), 이후 가도카와 문고, '일본어의 변천' 고단샤 학술 문고
- 『새 일본의 국어를 위하여』(新日本の国語のために) 아사히 신문사 (1948년)
- 『국어학 입문』(国語学入門) 요시카와 고분칸 (1949년)
- 『마음의 작은 길』(心の小径, 수필) 가도카와 쇼텐 (1950년)
- 『언어학 50년』(言語学五十年) 호분칸 (1955년)
- 『일본의 경어』(日本の敬語) 가도카와 신서 (1959년), 이후 고단샤 학술 문고
- 『긴다이치 교스케 집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金田一京助集 私たちはどう生きるか) 포프라샤 (1959년)
- 『긴다이치 교스케 선집 긴다이치 박사 희수 기념 제1권 (아이누어 연구)』(金田一京助選集 金田一博士喜寿記念 第1 (アイヌ語研究)) 산세이도 (1960년)
- 『긴다이치 교스케 선집 제2권 (아이누 문화사)』(金田一京助選集 第2 (アイヌ文化志)) 산세이도 (1961년)
- 『긴다이치 교스케 선집 제3권 (국어학 논고)』(金田一京助選集 第3 (国語学論考)) 산세이도 (1962년)
- 『긴다이치 교스케 수필 선집 제1-3권』(金田一京助随筆選集 第1-3) 산세이도 (1964년)
- 『내가 걸어온 길 긴다이치 교스케 자전』(私の歩いて来た道 金田一京助自伝) 고단샤 현대 신서 (1968년)
3.2. 공저 및 편집 저서
- 『아이누 어법 개설』(アイヌ語法概説) 지리 마시호 공저, 이와나미 쇼텐 (1936년)
- 『아이누 예술 제1-3권』(アイヌ芸術 第1-3巻) 스기야마 스에요 공저, 다이이치 세이넨샤 (1941-43년)
- 『아이누 동화집』(アイヌ童話集) 아라키다 이에즈 공저, 다이이치 게이분샤 (1943년), 이후 고단샤 문고, 가도카와 소피아 문고
- 『아이누 옛이야기』(あいぬの昔話) 아라키다 이에즈 공저, 고분샤 (1948년)
- 『리쿤베츠의 노인 아이누 옛이야기』(りくんべつの翁 アイヌ昔話) 지리 마시호 공편, 쇼코쇼인 (1948년)
- 『명해국어사전』(明解国語辞典) 산세이도 (1943년)
- 『지카이』(辞海) 산세이도 (1952년)
- 『고금와카집의 해석과 문법』(古今和歌集의 解釋과 文法) 타치바나 마코토 공저, 메이지 쇼인 (1954년)
- 『신선국어사전』(新選国語辞典) 사에키 우메토모 공편, 쇼가쿠칸 (1959년)
- 『예해학습국어사전』(例解学習国語辞典) 쇼가쿠칸 (1965년)
- 『산세이도 국어사전』(三省堂国語辞典) 긴다이치 하루히코, 시바타 다케시, 야마다 타다오, 겐보 고키 공편 (1960년)
3.3. 번역서
- 『신 언어학』(新言語学) 헨리 스위트 원작, 고분샤 (1912년 6월)
- 『아이누 성전』(アイヌ聖典) 세계성전전집·세계문고 (1923년)
- 『아이누 랏쿠루의 전설 아이누 신화』(アイヌラツクルの伝説 アイヌ神話) 세계문고간행회 (1924년)
- 『아이누 서사시 유카르』(アイヌ叙事詩ユーカラ) 이와나미 문고 (1936년), 이후 복간
- 『호장환의 곡 아이누 서사시』(虎杖丸の曲 アイヌ叙事詩) 세이지샤 (1944년)
- 『유카르집 아이누 서사시 제1-8권』(ユーカラ集 アイヌ叙事詩 第1-8) 가네나리 마쓰 필사, 역주, 산세이도 (1959-68년)
3.4. 기념 논문집
- 『언어민속논총 긴다이치 박사 고희 기념』(言語民俗論叢 金田一博士古稀記念) 산세이도 출판 (1953년)
- 『긴다이치 박사 미수 기념 논문집』(金田一博士米寿記念論文集) 산세이도 (1971년)
3.5. 작사 활동
- 이바라키현 미토 시립 제1 중학교 교가 (1952년)
- 도쿄도 스기나미구립 다카이도 중학교 교가 (1957년)
- 시즈오카현 야이즈 시립 오무라 중학교 교가 (1957년)
- 도쿄도립 도요타마 고등학교 교가 (1951년)
- 도쿄도 스기나미구립 히가시다 초등학교 교가 (1951년)
- 기후현립 다지미 기타 고등학교 교가 (1961년)
- 니가타현 니가타 시립 후지미 중학교 교가 (작사 연도 불명)
4. 가족 관계
긴다이치 교스케의 가족 관계는 그의 개인적인 삶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 아내: 시즈에(静江, 결혼 전 성은 하야시)
- 장녀: 이쿠코(郁子, 1911년생, 이듬해 병으로 사망)
- 장남: 하루히코 (언어학자)
- 차녀: 야요이(弥生, 1915년생, 같은 해 병으로 사망)
- 삼녀: 미호(美穂, 1916년생, 이듬해 병으로 사망)
- 사녀: 와카바(若葉, 1921년생, 병약함을 비관하여 28세에 타마가와 상수로에서 투신 자살)
교스케의 자녀 중 천수를 누린 이는 하루히코뿐이다.
- 동생: 히라이 나오에 (히즈메마치 의회 의장 역임)
- 백부: 긴다이치 가쓰사다 (기업가)
- 사촌 매형: 긴다이치 고쿠시 (가쓰사다의 양녀이자 교스케의 사촌 누이의 남편으로 기업가)
- 조카손녀: 긴다이치 아츠코 (1939년생, 고쿠시의 손녀로 다이에이 영화사에서 미인 여배우로 활동)
5. 연보
긴다이치 교스케의 생애와 주요 활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도 | 사건 |
|---|---|
| 1882년 (메이지 15년) | 금전일 구메노스케와 야스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남. |
| 1888년 (메이지 21년) | 모리오카 제일 심상 소학교(현 니오 초등학교) 입학. |
| 1892년 (메이지 25년) | 모리오카 고등 소학교(현 모리오카 시립 시모바시 중학교) 입학. |
| 1896년 (메이지 29년) | 이와테현립 모리오카 중학교(현 이와테현립 모리오카 제일고등학교) 입학. |
| 1901년 (메이지 34년) | 제2고등학교(현 도호쿠 대학) 입학. |
| 1907년 (메이지 40년) | 도쿄 제국대학 문과대학 언어학과 졸업. 졸업 논문은 "세계 언어의 조어". 7월, 홀로 남사할린에 건너가 사할린 아이누어 조사. |
| 1908년 (메이지 41년) | 가이조 중학교에 교사로 부임했으나 10월 실직. 이시카와 다쿠보쿠 상경. 산세이도 교정 담당, 고쿠가쿠인 대학 강사로 활동 시작. |
| 1909년 (메이지 42년) | 12월 28일, 하야시 시즈에와 결혼. |
| 1912년 (다이쇼 원년) | 우에노 식민 박람회에서 시운코쓰의 노파 고포아누를 만나 유카르와 아이누어에 대해 질문. 이시카와 다쿠보쿠 사망. |
| 1913년 (다이쇼 2년) | 7월부터 8월 말까지 고포아누의 추천으로 맹인 유카르 전승자 시운코쓰의 와카루파를 도쿄로 초빙.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유카르 "호장환"을 로마자로 필사. 와카루파는 연말에 고향에서 서거. |
| 1915년 (다이쇼 4년) | 가을, 시운코쓰를 방문하여 노파들의 이야기 노래를 채집, 필사. |
| 1918년 (다이쇼 7년) | 존 배첼러의 소개로 가네나리 마쓰의 집을 방문, 마쓰의 어머니이자 "마지막이자 최대의 유카르 전문가" 모나시노우쿠, 당시 16세였던 지리 유키에와 조우. |
| 1922년 (다이쇼 11년) | 고쿠가쿠인 대학 교수, 이후 명예 교수. |
| 1923년 (다이쇼 12년) | 와카루파가 소개했던 눅키베쓰의 구로카와 쓰나레를 방문하여 "호장환"을 완전히 필사. |
| 1925년 (다이쇼 14년) | 4월, 오카쿠라 요시사부로의 추천으로 릿쿄 대학 문학부 교수로 취임. |
| 1926년 (다이쇼 15년) | 다이쇼 대학 전임 강사 (~1940년). |
| 1928년 (쇼와 3년) | 도쿄 제국대학 조교수. |
| 1931년 (쇼와 6년) | 『아이누 서사시 유카르의 연구』 2권 간행. |
| 1932년 (쇼와 7년) | 전년도 『유카르의 연구』로 온시상 수상. |
| 1935년 (쇼와 10년) | 문학박사 학위 취득. 논문은 "유카르의 어법 특히 그 동사에 대하여". 도쿄 대학 쇼기 연맹(도쿄 제대, 도쿄 상업대, 와세다 대학, 릿쿄 대학 참가) 결성 시 회장을 역임. |
| 1940년 (쇼와 15년) | NHK 방송 용어 위원 (~1962년). |
| 1941년 (쇼와 16년) | 도쿄 제국대학 교수 (~1943년). |
| 1942년 (쇼와 17년) | 훈4등 수여. |
| 1943년 (쇼와 18년) | 도쿄대 퇴직. 산세이도 『명해국어사전』 간행. |
| 1948년 (쇼와 23년) | 일본학사원 회원. |
| 1952년 (쇼와 27년) | 국어심의회 위원 (~1958년). |
| 1954년 (쇼와 29년) | 문화훈장 수훈. |
| 1959년 (쇼와 34년) | 모리오카 시 명예 시민 1호 칭호 수여. |
| 1967년 (쇼와 42년) | 일본 언어학회 2대 회장 (~1970년). |
| 1971년 (쇼와 46년) | 89세로 사망. 법명 "주토쿠인덴 테쓰겐카메이 다이고지". 종삼위·훈1등 서보장 추서 (전쟁 전에 받았던 종4위 훈4등에서 사망 시 추서). |
6. 평가와 유산
긴다이치 교스케의 업적은 일본 언어학, 특히 아이누어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그의 생애와 학문은 후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논의되고 있다.
6.1. 긍정적 평가
긴다이치는 평생을 아이누어 연구에 바쳤으며, 그의 손자 긴다이치 히데호는 "교스케가 없었다면 아이누어는 남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그의 공헌은 지대하다. 그는 당시 아이누 민족이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던 시기에도 "아이누는 위대한 민족이다", "당신들의 문화는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아이누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특히 그는 아이누 서사시인 유카르의 구술 전승이 사라지기 전에 이를 채록하고 번역하여 학문적으로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31년 출간된 그의 대표작 『유카르의 연구: 아이누 서사시』는 이 분야의 금자탑으로 평가받으며, 이듬해 온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명해국어사전』 편찬에도 참여하여 일본어 사전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전후에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인 『중등국어 긴다이치 교스케 편』을 집필하여 수십 년간 채택률 1위를 차지하며 일본의 국어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54년 문화훈장을 수훈했고, 1959년에는 모리오카시 명예 시민 1호로 선정되는 등 생전에 그 학문적 공로를 인정받았다.
6.2. 비판과 논란
긴다이치 교스케의 아이누어 연구는 그의 공헌만큼이나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그는 일본의 동화 정책에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초기 그의 저술에서 "미개인의 세계로 되돌아가, 몽매하고 저급한 문화 속에 언제까지나 방황하며 사는 것인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아이누 문화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시각을 보인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그는 아이누인들이 아이누어를 버리고 일본어로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이누 학자인 그의 제자 지리 마시호는 후년에 스승인 긴다이치 교스케를 비롯한 일본 학자들의 아이누어 연구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긴다이치는 지리의 저서에 대한 추천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는 지리가 자신을 질투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1923년 호장환의 곡을 완벽히 필사하기 위해 위독한 유카르 명인 구로카와 쓰나레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만난 일화는 그의 연구 방식에 대한 윤리적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친우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로마자 일기』가 출판될 때 자신의 딸 결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일기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쿠보쿠의 만년에 "사상적 전환"이 있었다고 주장한 점은 연구자 이와키 노리노리와의 논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와키의 실증적 주장이 통설이 되었다.
6.3.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긴다이치 교스케의 이름은 일본 대중문화에서도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미스터리 소설가 요코미조 세이시의 추리 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 긴다이치 고스케의 이름은 긴다이치 교스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요코미조는 『본진 살인사건』을 집필하던 중 새로운 탐정의 이름을 구상하다가, 당시 자신이 살던 도쿄 기치조지의 이웃 모임에 있던 '긴다이치 야스조'라는 인물에게서 영감을 받아 '긴다이치' 성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긴다이치 야스조가 유명한 언어학자 교스케의 친동생(전기공학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교스케'(京助)라는 이름도 빌려 '고스케'(耕助)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긴다이치 교스케의 장남인 긴다이치 하루히코는 긴다이치 고스케 이전에 '긴다이치' 성이 희귀하여 '가네다'(金田)로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코미조 작품의 영향으로 이 성이 널리 알려지고 누구든지 정확히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천금을 쌓아도 아깝지 않다"고 감사했다고 한다.
7. 수상 및 영예
긴다이치 교스케는 그의 학문적 공헌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생전에 여러 상과 영예를 얻었다.
- 문화훈장 (1954년)
- 훈1등 서보장 (1971년, 사후 추서)
- 종삼위 (1971년, 사후 추서)
- 훈4등 (1942년)
- 모리오카시 명예 시민 1호 (1959년)
- 온시상 (1932년, 『유카르의 연구 아이누 서사시』로 수상)
- 문학박사 학위 (1935년, 도쿄 제국대학에서 취득)